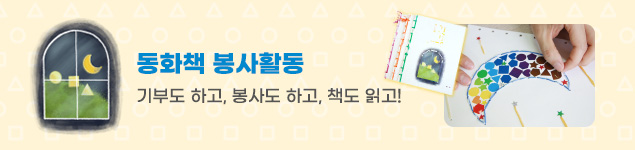“걷는 대신 날거야” 휠체어 타는 케냐 다섯 살 소녀의 꿈
- 2019.11.26
- 2,532
관련링크
본문

“열심히 공부해서 비행사가 되고 싶대요.”
헬렌(5)의 고모 로다(19)가 꺼낸 말에 선뜻 반응하지 못했다. ‘비행사’라는 단어가 유독 무겁게 느껴져서였다. 아프리카의 강렬한 햇볕 아래 휠체어를 탄 아이의 체구는 조종석에 앉기에는 너무 작았다. 손목은 가늘었고, 다리는 휘어져 있었다. 성인이 돼도 그대로일 터였다. 케냐 외곽지역 리무르. 그곳의 기찻길 옆 양철집에 사는 헬렌을 최근 아동전문 비정부기구(NGO) 라이프오브더칠드런(라칠)과 함께 만났다.
걷지 못하면 날아서… 헬렌이 꾸는 ‘꿈’
수도 나이로비에서 차로 40분쯤 달려야 닿는 리무르 지역. 지난달 31일 오후 이곳의 기차역 인근에 위치한 헬렌의 집에 도착했다. 집이라기에는 양철판 몇 개를 빙 두른 게 전부였다. 그곳에 헬렌, 부모님, 오빠 두 명과 할머니까지 여섯 식구가 살았다. 공간이 좁아 집 앞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헬렌은 낮볕이 따가운지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입만은 웃고 있었다. 휠체어를 선물해준 라칠이 반갑고 고마워서였을 것이다. “지난해 만났을 때는 이렇게 웃지도 못했어요.” 라칠의 현지 조력자로 활동하는 이태권 선교사가 그런 헬렌을 보며 말했다.
헬렌은 선천적 칼슘부족증을 앓고 있다. 돌 무렵 넘어졌다가 팔다리 골절상을 입었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뼈가 굽은 상태로 붙었다. 당시 하루 5000원 남짓한 수입으로 생활하던 헬렌 가족에게 치료비는 큰 부담이었다.
그런 헬렌과 이 선교사가 만나게 된 것은 라칠에서 운영하는 해외아동 결연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로다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후원자의 후원을 받고 있었고, 자연스레 헬렌의 사례도 라칠에 알려졌다. 첫 만남 당시 헬렌은 통증이 심한 부위에 다른 사람의 손만 닿아도 울었다고 한다. 이렇게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진통제가 지원된 덕분이었다.
라칠은 올해 초 모금 활동으로 휠체어와 생활비를 마련해 헬렌 가족에게 전달했다. 걷기 등 상태 호전을 위한 수술 방법을 모색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아서였다. 그래도 로다는 “헬렌이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데려갈 수 있다”며 기뻐했다. 헬렌은 이제 유치원도 다닌다.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전남 순천의료원 노형민 내과전문의가 헬렌의 다리를 살피는 모습
작별인사 전 헬렌에게 휠체어가 생겨 행복한지 물었다. 수줍음이 많다는 이 선교사의 설명대로 헬렌은 대답 대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비행사가 되고 싶니?” 다시 한번 묻자 이번에도 헬렌의 고개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로다가 “헬렌은 비행사가 돼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걷는 대신 날 수 있을까. 실현되고 말고는 중요치 않을지도 몰랐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밖에 나갈 수 없던 아이에게 꿈이 생겼다. 그거면 충분했다.
케냐 오지마을 ‘난디’와 ‘마구무’
라칠은 케냐 오지마을인 난디, 마구무에서 각각 지난달 28, 29일과 31일 사흘에 걸쳐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전남 순천의료원(정효성 원장) 의료진과 케냐에서 6년째 의료사역 중인 이대성 선교사(간이식 전문의)가 환자를 살폈고, 케냐 한인교회(홍성무 목사)는 접수대를 맡았다. 스와힐리어가 유창한 오유진, 안경열 선교사는 통역을 도왔다.
라칠의 무료 진료소는 새벽부터 찾아온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진료 시작 전부터 주민 10여명이 미리 와 줄을 섰고, 오후가 되면서 대기 인원은 40~50명으로 늘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 학생, 임신부, 멀리서 찾아온 할머니와 할아버지까지 환자는 다양했다. 난디에서 이틀간 600여명, 마구무에서는 하루 300여명의 환자가 라칠 봉사단의 진료를 받았다.
감기나 결막염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환자가 주를 이뤘지만, 급박한 순간도 종종 있었다. 얼마 전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진 뒤 발목이 무척 아팠다는 난디 소년 브라이언(14)은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한 뒤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병원에서의 추가 진료를 권했다. 봉사 장소였던 난디 유일의 의료기관 ‘메테이테이 서브카운티’에는 공립병원인데도 엑스레이 촬영 장비가 없었다.
일부는 만성질환이나 통증의 원인을 찾기도 했다. 난디에서 만난 샐리(40)의 오른쪽 발목은 왼쪽보다 1.5배 정도 두꺼웠는데, 14세 때 생긴 상처가 원인이었다. 제대로 치료받지 않아 부어올랐고, 정맥 부분이 눌리며 더 심하게 붓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한다. 오지마을 주민들은 이런 아픔과 불편함을 참는 데 익숙했다.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1%의 생명을 위해
라칠을 찾아온 환자 대부분은 지역 병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약’을 꼽았다. 약품의 종류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봉사 둘째날 만난 넬리(48)는 “10년간 지속된 질환 때문에 여러 차례 병원을 다녔지만 진통제만 주더라”고 말했다. 난디 서브카운티 병원의 한 직원은 한국 약을 처방받고 싶다며 라칠 봉사단을 찾아오기도 했다.
또 다른 문제는 거리였다. 엑스레이 등 그나마 의료기기가 갖춰진 타 지역 공립병원에 가는 일도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은 이들에게는 쉽지 않다. 이런 열악한 상황을 피해 사립병원에 가는 것은 더욱 꿈같은 일이다. 이대성 선교사는 “사설병원 응급실에서 수액과 진통제만 처방받아도 수십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봉사에도 한계는 있었다. 청진기와 육안, 환자의 설명에 의존해 판단해야 하고 한국에서 공수해오다 보니 처방이 가능한 약도 제한적이다. 이 선교사도 “수술이 필요하거나 암 환자의 경우 잘 설명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그가 의료봉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명확했다.
“진료실에 오는 수백명의 환자 중 몇몇은 증세가 크게 호전되거나 극적으로 목숨을 구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질환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말라리아 환자는 초기 치료만 잘 받아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런 1%의 환자를 위해 하는 거죠.”
난디, 마구무(케냐)=글·사진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8813&code=11131100&cp=nv